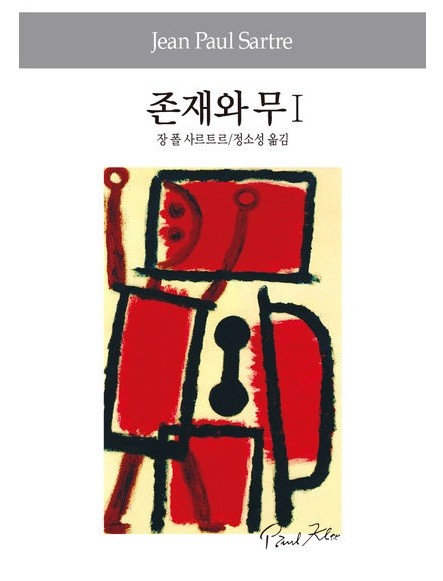
즉자 卽自 Ansich
'즉자'는 '다른 것'과의 관계없이 오로지 그 자신에서(anshich) 주제로 되는 일이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대자'와 맞짝을 이루는 인식의 존재방식이나 사물의 존재방식 내지 그 본성을 가리킨다. '자기가 자신에 게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자기의 본성을 꼭 들어맞게 몸에 맞추고 있지만 무자각적'이라는 의미로 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젊은이, 어른이 각각의 단계에 대응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즉자대자'는 최초의 '즉자'로의 단순한 복귀, 재현이 아니라 거기에 잠재적으로 파함되어 있던 것의 '전개', '실현'으로 간주되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은 '즉자'로 되어 한층 더 전개되어 가게 된다.
인식의 대상도 그 인식의 수준에 따라 '즉자'로부터 점차적으로 고차화되어 가지만, 다른 한편 시간속에서 생성, 변화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 도식을 적용하여 생각된다. 예를 들면 종자가 큰 나무로 되는 과정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분명히 '운동'을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그것으로서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식의 실례를 헤겔저작의 모든 곳에서 차장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배후에는 모든 것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거도 중층적으로 매개되어 있다는 이해가 놓여있다. 이와같이 보면 '즉자'는 사실 '매개'관계를 사상하여 얻어진 '추상적인 것' 내지 '매개'가 '지양'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칸트의 '사물 자체' 에 대한 비판은 그것의 전형적인 하나의 예이다.
대자 對自 fürshich
'향자(向自)', '자독(自獨)' 등이라고도 변역된다. ;즉자'가 '타자'와의 관계를 지니지 않거나 지닌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 것이자 외적인 무관심한(indifferent)것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대자'는 '타자'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타자'와의 관계르 내면화한 바의 "부정적 자기관계"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즉자'가 그것으로서 '타자'와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은 사태적으로는 그것에 선행하는 '대자'에서 '타자'와 구별된 '자기'가 성립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대자'의 관계가 사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자'없이는 분절화되지 않은 무차별한 다양과 혼돈이 있을 뿐이다. 역으로 말하면 '대자'에서 비로소 "관념성"이라는 규정이 들어온다. ...... 유한한 것의 진리는 오히려 그 관념성에 있다". 분절화된 세계로서의 세계는 대자의 지평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자존재'의 단적인 예로서 헤겔은 '자아'를 들고 있다. "우리가 나(자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한임과 동시에 부정적인 자기 관계의 표현이다". 무한이라는 것은 타자라는 한계를 지니지 않는 자기관계이기 때문이며, 부정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한정, 규정하기 때문이다(스피노자).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의 대자존재는 직접성[무매개성]이며, 부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의 그것은 대자좆냊자, 일자이다. 일자는 자기 자신 내에 구별은 지니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로부터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며, 오히려 이 관계에서 비로소 하나의 통이로서의 (일자) '자기'로 되고 '타자'와의 관계가 생긴다. 그 내실을 이루는 것이 '참된 무한성'이며, 그것은 "이행 및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자(또는 즉자적인 것)와 대자(또는 대자적인 것)는 헤겔 철학에서 역사의 변증법적 과정을 해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쌍이다. '즉자'란 사물이 직접 드러난 현상이나 존재, 실체를 가리키며, 대자는 그 실체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서 인식되는 행위이자 주체화되는 상태로서 변증법적 지양을 거쳐 개념화된 인식된 상태를 가리킨다. 헤겔 철학에서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은 사물이 직접 드러난 현상인 즉자가 다른 것과 교섭하면서 자기의 자립성을 잃게 되는 대타로 발전하고 지양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자기 자신과 관계함으로써 자기를 회복하는 단계인 대자로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보면, 즉자는 다른 존재와의 연관에 따라 규정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미발전,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직접태이자 잠재태로서 자기에 대한 반성적 관계가 결여된 상태라는 뜻에서 '무자각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자가 다른 것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전환은 대자로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실체에서 주체로의 전환이며, 의식의 대상에서 자기의식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 얼마나 행운인가! (0) | 2022.03.10 |
|---|---|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0) | 2022.03.09 |
| 우리는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와인은 병에 담은 시다. 위스키는 액체에 녹아든 햇빛이다. (0) | 2022.02.27 |
| 래퍼곡선 (0) | 2022.02.26 |
| 바야흐로 100세 시대... 노년층도 70세 넘어야 노인 (0) | 2022.02.26 |


